스탠포드 창의력 교수 Jeremy Utley의 현실 조언
요즘 챗GPT 열심히 쓰고 있다면, 이 말 기억해둬.
“LLM을 구글 검색창처럼 쓰는 순간, 너는 그 1%도 못 쓰고 있는 거야.”
요즘 챗GPT나 Claude 같은 AI 툴 쓰는 사람 많지? 근데 이 툴들을 진짜 잘 쓰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어. 왜냐면 우리가 AI를 ‘검색창’처럼 쓰도록 학습돼 있어서 그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창의성과 AI를 가르치는 Jeremy Utley 교수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지적해. 구글 검색창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는 입력창만 보면 “여기에 뭘 넣어야 하지?”라는 식으로 자동 반응하게 돼. 그런데 문제는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니라는 거야. 검색하듯 써버리면 이 툴이 가진 엄청난 가능성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지.
타자를 치지 말고, 그냥 말해
Jeremy는 “손가락보다 목소리를 써라”고 말해.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떠드는 게 가능하거든.
‘뭐부터 쓰지?’ 이런 부담이 없어.
오히려 그게 진짜 생각을 꺼내주는 열쇠야.
실제로 Jeremy는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한 후,
“AI야, 방금 대화 바탕으로 나 인터뷰해줘. 그걸 바탕으로 아웃라인 좀 짜봐.”
이런 식으로 협업한다고 함.
“AI는 도구가 아니라 팀원이야”
그가 연구에서 발견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 AI를 도구처럼 쓰는 사람 = 성과 별로
👍 AI를 팀원처럼 대하는 사람 = 창의력 폭발
‘도구’처럼 쓰면 그냥 답 듣고 끝.
근데 ‘팀원’처럼 대하면 이렇게 묻지:
-
“이 질문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나에 대해 뭘 더 알아야 더 잘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AI한테도 질문하게 하면, 진짜 협업이 시작되는 거야.
공무원이 만든 AI툴 하나가 만든 기적
국립공원 레인저 ‘Adam’이라는 분 이야기.
카펫 타일 하나 교체하려면 2~3일치 서류작업을 해야 했대.
근데 Jeremy의 강의 듣고 나서, AI로 그 문서 자동화 툴을 만들었어.
딱 45분 걸림.
그 툴이 전국 430개 공원에 퍼졌고,
무려 연간 7,000일치 인간 노동을 절감하고 있음.
비개발자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
진짜 문제는 ‘몰라서’ 못 쓰는 것
사람들이 AI를 잘 쓰고 싶어 해도,
기초 언어 자체를 몰라서 막막한 경우가 많대.
그래서 Jeremy는 AI의 기술보다 먼저
‘어떻게 같이 일할 것인가’를 가르친다고 해.
그의 말에 따르면,
AI는 우리를 25% 더 빠르게, 12% 더 많이, 40% 더 좋게 만든다.
근데 이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고작 10% 미만.
그걸 그는 리얼라이제이션 갭(Realization Gap) 이라고 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더 잘 쓸 수 있냐고?
- AI한테 “너 전문가야, 내 일에 AI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인터뷰 좀 해줘”라고 해봐
- 갈등 있는 동료랑 대화 연습이 필요해? AI한테 역할극 시켜봐
- 아티클 초안 짜야 해? 음성으로 말하면 AI가 정리해줘
- "다르게 써보자"는 실험 정신이 중요해. '첫 생각'에만 머물지 말자
-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두 번째 생각’을 하는 힘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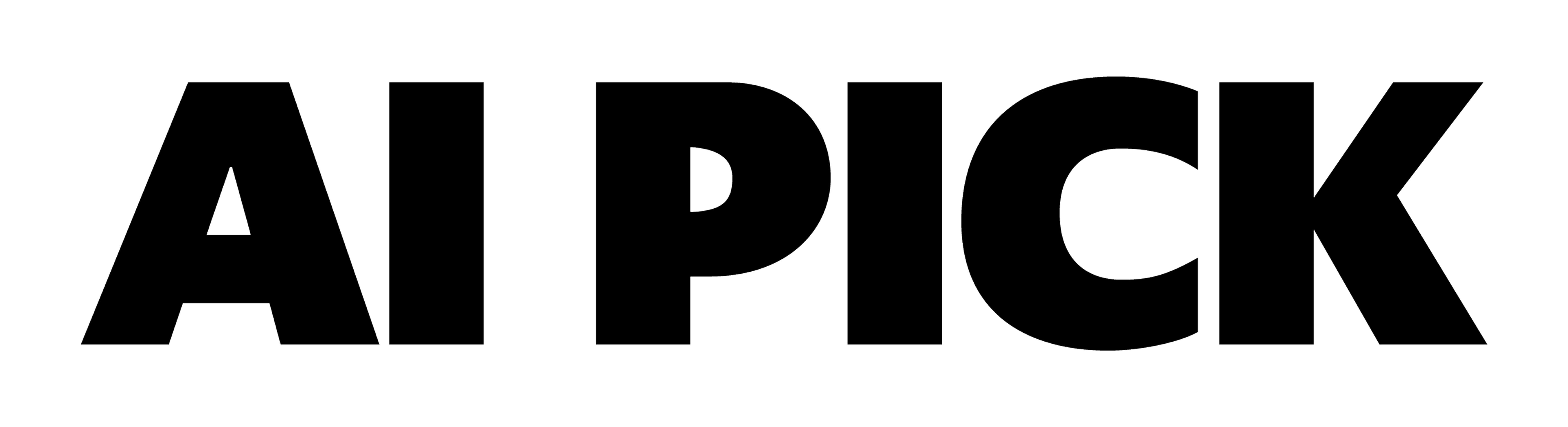

![[운영자] 부키](/static/images/upload_profile_images/20250430111850_Frame_44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