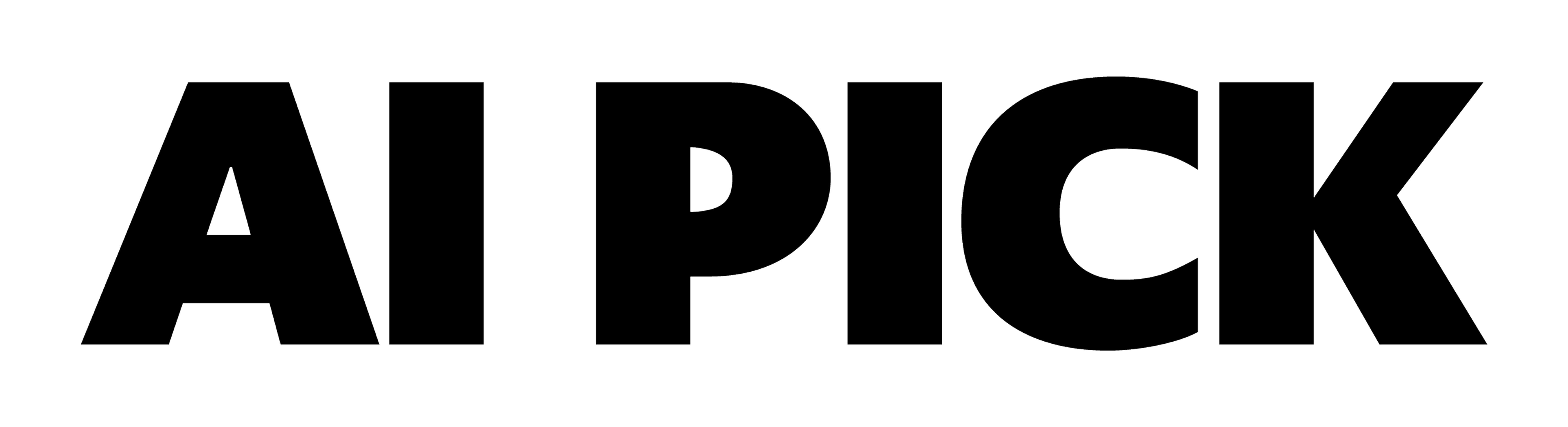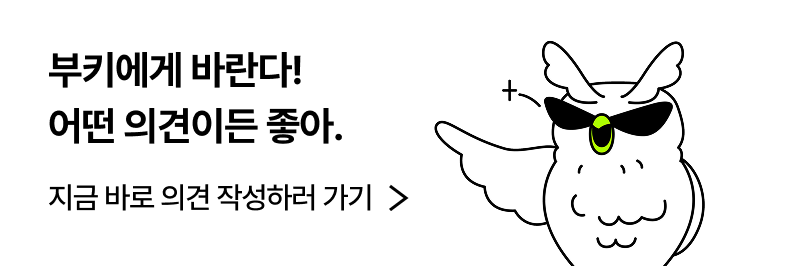인간처럼 생각 vs 완벽한 로봇? AI 두뇌 설계 전쟁 발발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5.01 09:51

기사 3줄 요약
- 1 AI 지식 표현 두고 MIT와 스탠포드 견해 대립
- 2 MIT는 유연한 구조, 스탠포드는 엄격한 논리 중시
- 3 두 접근 방식 모두 현대 AI 발전에 영향 미쳐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AI가 어떻게 ‘생각’하도록 만들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동부의 명문 MIT와 서부의 강자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AI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때는 1970년대 후반, 과학자들은 컴퓨터가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길 바랐습니다. 초기 전문가 시스템들은 정해진 규칙대로는 잘 작동했지만,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죠. 이를 넘어서기 위해 ‘논리’를 AI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수학처럼 명확한 규칙으로 AI의 생각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AI한테 지식은 어떻게 가르쳐?
스탠포드 대학의 존 매카시 교수는 일찍이 1958년에 AI가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이후 프로그래밍 언어 ‘프롤로그(Prolog)’나 여러 전문가 시스템 개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술어 논리’라는 형식 논리는 AI가 세상을 기호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진들은 이렇게 수학처럼 엄격하고 빈틈없는 논리 체계를 AI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AI가 내린 결론은 언제나 증명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마치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말입니다.근데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하지만 MIT의 마빈 민스키 교수 같은 학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순수한 논리만으로는 인간의 ‘상식’적인 판단이나 애매모호한 상황 대처 능력을 따라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는 난다”는 지식이 있지만, “펭귄은 새지만 날지 못한다”는 예외를 논리만으로 처리하기는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스키는 ‘프레임(Fram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지식을 하나의 묶음(프레임)으로 만들어, 관련된 정보를 유연하게 연결하고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처럼 연상 작용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MIT 연구진들은 이런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봤습니다.그래서 결국 누가 맞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았습니다. 스탠포드의 엄격한 논리 기반 접근 방식은 AI 연구의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고, 특히 정확성이 중요한 의료 진단이나 금융 분석 같은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반면 MIT의 유연한 구조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한 AI,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한 AI 개발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갈래의 흐름, 즉 ‘엄격한 논리’와 ‘유연한 구조’ 사이의 고민은 오늘날 AI 개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최신 AI들도 결국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파악하는 방식(MIT 방식과 유사한 면)과 논리적 추론 능력(스탠포드 방식의 발전형)을 결합하려 노력하고 있죠. 결국 AI가 인간 지능의 어떤 면을 닮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완벽한 논리 기계일까, 아니면 인간처럼 유연하게 생각하는 존재일까? 아마 정답은 한쪽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잘 융합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 오래된 논쟁은 AI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제보·문의:
aipick@aipick.kr

부키와 모키의 티격태격
찬/반 투표
총 투표수: 0AI는 논리적이어야 할까, 인간적이어야 할까?
논리적
0%
0명이 투표했어요
인간적
0%
0명이 투표했어요
댓글 0개
관련 기사
최신 기사